
꼭 일 년 전에 남편이 잡아끌어 다녀왔던 통영이다. 거절할 힘은 없고, 무력하게 따라가긴 싫었던지 '도다리 쑥국'을 명분으로 내세웠었다. "그래, 어디서 통영 도다리 쑥국 봤는데 먹고 싶더라" 뭘 먹고 '싶다'는 말이 낯설고 생소한 시간이었으니 그럴듯한 이유가 되는 것 같았다. 오직 도다리 쑥국만 생각하고 간 통영에서 운명처럼 만난 것은 동백꽃이었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들어선 공원에 동백꽃이 한창 피고, 한창 지고 있었다. 툭, 꽃봉오리 째 떨어져 뒹구는 붉은 동백꽃이 훅 가슴으로 들어왔다. 눈물이 쏟아졌다. 그즈음은 우는 게 일상이었으니 언제 어디서 울어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찬란한 슬픔'이라 이름 붙인 그 동백꽃을 다시 만나러 간 것이다. 일 년 전 그 통영에서 올라오면서 남편과 약속했었다. "내년 이맘때 또 오자!" 믿을 수 없는 시간, 1년이 지났고 남편 대신 채윤이와 다녀왔다. 올해는 오직 떨어져 누운 동백꽃을 만나러 간 것이었다.
1년 전 그 통영은 없었다. 작년 바로 그날인데 동백꽃은 죄 지고 벚꽃이 만발해 있었다. 응달에 선 키 작은 동백나무가 뒤늦게 피어난 한두 송이 꽃을 지나친 푸르름으로 안고 있는 정도였다. 내 가슴에 파고들었던 그 찬란한 슬픔, 붉은 그리움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게다가 도다리 쑥국도 맛이 없었다. 여기에 더해 바닷가를 하염없이 걷기로 했던 여행 이튿 날엔 최악의 미세먼지로 실내를 벗어날 엄두가 나지 않은 정도였다. 그리 아쉽지는 않았다. 아름다운 기억을, 경험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면 그게 차라리 기적이고, 그걸 기대하는 것이 환상일 테니까. 애초 불가능한 일이었다. 시공간, 물리적 조건을 완벽하게 복사해놓았다 해도 내가 달라졌으니 말이다. 작년 남편 손에 이끌려 통영에 갔을 때는 세상이 그저 흑백이었는데, 올봄 나는 이 연둣빛 세상을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선 감동에 하루하루 보내고 있지 않은가. 매일 산책하며 하루 분량의 짙어지는 생명의 빛에 감탄하고 있다. 작년 오늘의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오늘의 나다.
엄마 1주기를 기념한 통영 행이었지만 어째 엄마의 자리는 크지 않았다. 동백꽃도 없었고. 차라리 그 1년을 버티고 살아온 나, 오롯이 나를 위한 이기적인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겠다. 딸 채윤이가 든든한 조수로 함께 했다. 조수석에 앉아서 장거리 운전에 피곤하진 않은지 살피고. ("엄마, 피곤해? 졸리지 않아?" 살피고 살피다 갑자기 제가 곯아떨어지긴 했지만) 미세먼지로 해변 산책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특유의 지리 감각을 발휘하여 지도 검색을 하더니 멋진 드라이브 코스로 안내하기도 했다. 나가사키의 소토메 마을 같았다. "인간은 이렇게 슬픈데, 주여, 바다가 너무나 파랗습니다." '침묵의 비'가 있는 엔도 슈사쿠의 그 마을 말이다. 슬프고 슬픈 인간의 실존도, 푸르를 뿐인 바다도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다. 인간의 슬픔의 늪을 헤매고 있는데 아랑곳없이 푸르른 바다가 야속하기도 하지만, 내 슬픔이 어떠하든 무덤덤하게이 제 생긴 모양을 지키는 바다나 자연은 고맙기도 하다.
채윤이가 가보고 싶다는 독립서점을 찾아 갔다. 주소 찍고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갔는데, 어머! 작년 남편과 함께 와서 걸었던 벚꽃 길이다. 꼭 다시 가보고 싶었지만, 일부러 찾으려 했어도 어려웠을 텐데. 동백꽃 대신 화사한 벚꽃이 맞아주는 것 같았다. 곳곳에서 벚꽃이 반겨주었다. 통영에 갈 때마다 관광 안내지에서만 봤던 '윤이상 기념관'에 들렀다. 미세먼지 몰려오기 전이었다. 전시관을 둘러보고 햇살 좋은 야외 공원을 걸었다. 한 아이가 눈 앞에서 통통 뛰어다니더니 갑자기 내게 다가와 벚꽃 몇 송이를 내밀었다. 얼떨결에 받아 들고 정신을 차려보니 아이는 통통 뛰어 벌써 저쪽으로 사라지고 있다. 내 손에는 작은 벚꽃 다발이 들려져 있고.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아이 같았다. 작년 어느 공원에서 눈 앞에 펼쳐진 붉은 동백꽃의 향연만큼이나 갑작스러웠다.
1년 만에 같은 자리에 서보니 지나온 1년이 아득하기만 하다. 그 흑백의 시간을 어떻게 헤쳐왔단 말인가. 어떻게 헤쳐나와 오늘 이렇듯 흩날리는 벚꽃에 감탄하고 있는가. 어쩌면 이렇게도 아무 걱정 없이 채윤이와 달착지근한 수다로 시간을 보내고 있단 말인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할 일이다. 일 년 전 통영과 오늘의 통영. 뚝 떼어놓고 보니 또렷한 변화이지만, 어디 하루아침의 일인가. 작년에 집으로 돌아가기 전, 한산도를 바라보며 남편과 나눈 대화가 생각난다. "이제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 집 거실과 안방 침대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게 두려워. 거기서 견뎌야 할 시간이 막막하기만 해". 거실과 안방 침대에서, 다시 꼼짝하지 않고 지낸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 겨울이 있어서 다시 만난 통영의 봄이 새로운 것이다. 일 년의 '오늘'을 견디고 얻은 오늘이다. 엄마와 함께 했던 52년보다 엄마 생각을 더 많이 하면 지낸 일 년이다. 엄마의 몸이 사라진 자리에서 엄마의 존재는 더 커졌고, 투명해졌다. 거실과 안방 침대를 피하지 않고, 아니 피할 곳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울고, 그리워하고, 잠든 날이 쌓였다. 엄마가 남긴 것들을 또렷하게 느끼고 있으니 몸은 떠났지만 빛나는 영혼으로 존재하는 엄마와의 연결이다.
통영 다녀온 다음 날이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중이었다. 주유원은 연세 지긋한 어르신이었다. 자동차 뒷 창에 붙인 세월호 노란리본에 딴지를 걸었다. "저걸 아직도 달고 다녀요? 언제 적 세월호야? (쯧쯧)" 익숙한 상황이다. 짧은 순간 여러 생각과 말이 스치지만 무반응으로 지나치곤 한다. 표정까지 무반응일 수는 없었나 보다. 내 표정을 살피더니 '아, 고객님이지!' 싶었는지 힘이 쫙 빠져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아니, 이제 잊어야지 뭐...." 했다. 안전핀이 뽑혔다. 뭔가 치밀어 올랐다. 잊으라니, 이제 그만 잊으라니. 분노, 설움, 슬픔... 한꺼번에 폭발할 것 같았다. 저 입 다물게 할 말이 무얼까. "내 아이예요. 내가 세월호에서 아이를 잃은 엄마라고요!"라고 할까? 아무 말 못 하고 차에 올랐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잊으라니, 잊으라니... 잊을 수 없겠구나, 결코 잊을 수 없겠구나, 잊은 게 아니었구나! 멀쩡하고 즐겁게 통영 다녀온 것은 엄마를 잊었기 때문이 아니다. 텅 빈 마음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기에 그저 그대로 끌어안고 사는 것이지. 잊어서는 아니다. 잊지 못할 것이다. '애도에 완성이나 종결은 없으며, 애도는 실패해야 그것도 ‘잘 실패해야 성공한 것'이라는 데리다(Jacques Derrida)의 말을 알아듣는다. 동백꽃이 벚꽃이 되고, 봄이 여름이 되고, 1주기가 2주기, 10주기가 되어도 애도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침표 없는 애도, 잊지 못함은 엄마와 나를 새로운 끈으로 연결한다. 새롭게 잊지못할 때 새로운 만남으로 엄마를 다시 만난다. 엄마의 빛나는 영혼을 만난다. 나 또한 이 작은 몸을 떠나 영혼으로 남을 때, 영혼과 영혼으로 엄마를 만말 그때까지 애도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잊지 못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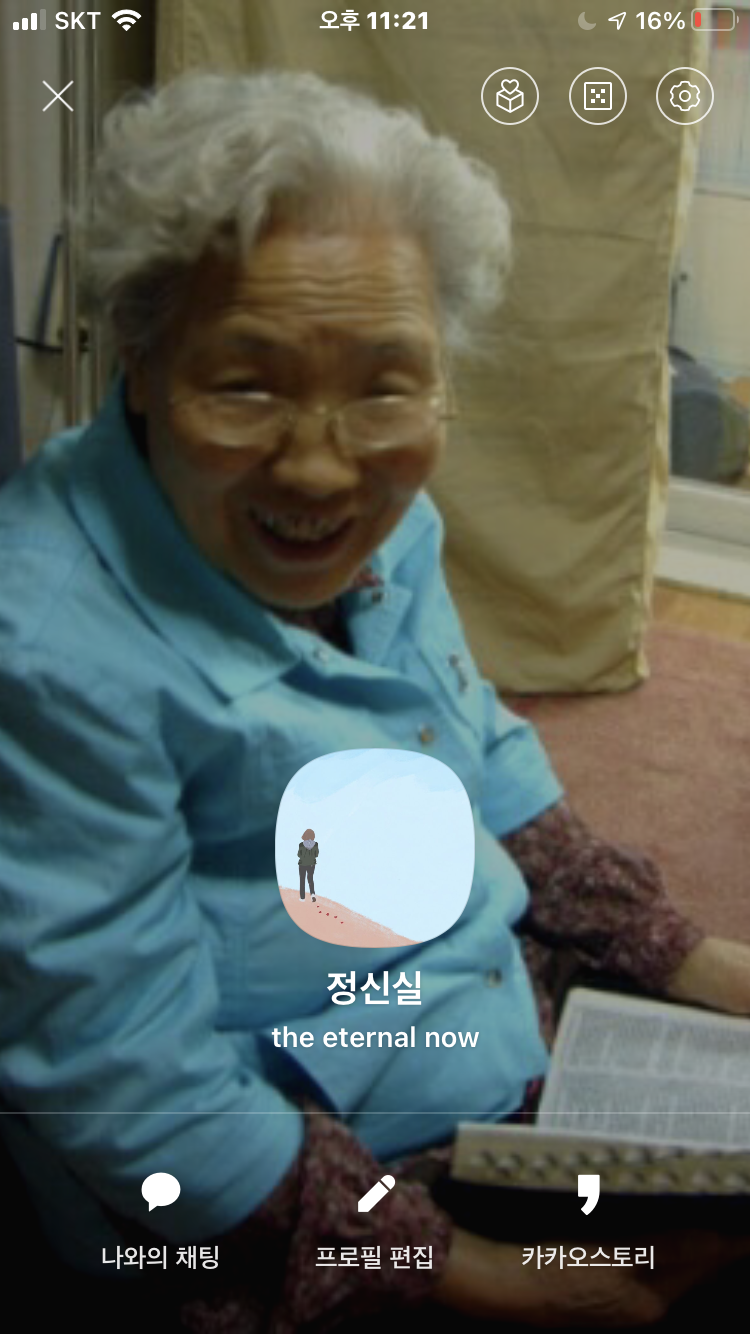
'세상에서가장긴장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어버이 날에_기름 한 병에 담긴 은혜 (2) | 2020.05.08 |
|---|---|
|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2.1 (0) | 2020.04.02 |
| 세상에서 가장 긴 장례식 (5) | 2020.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