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미라 선생님이 이끄는 송년 글쓰기 모임에 참여했다. 한 해를 돌아보며 2021년에 이름을 붙여보니 "사선(死線)을 넘어"였다. 죽을 고생 했다는 뜻은 아니다. 돌아보니 올해의 키워드도 '엄마'였다. 은근하게, 더 진득하게 엄마였다. "아직도 더 울고 싶구나!" 알게 되었다. 1월부터 차근차근 돌아보는데, 6월 말 <슬픔을 쓰는 일> 출간을 기점으로 희한하게 눈물이 잦아들었다. '사선을 넘었다'는 표현은 어떤 경계를 넘어 죽음에 한 발 다가갔다는 뜻일 수도 있고, 비로소 한 발 떨어져 죽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출간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 그리고 출간 이후의 시간은 엄마의 죽음, 아니 죽음 자체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 과도한 두려움으로 차마 정신 똑바로 차리고는 마주하지 못할 것이 죽음이었다. 다시 '죽음을 짊어진 삶'이란 언표를 꺼내야 하나보다. 등 뒤에 죽음의 흔적을 딱 붙이고 평생 살면서, 심지어 잘도 살아내면서 죽을 만큼 죽음을 두려워 하며 살았다. 엄마를 보내 드리고, 흑백의 나날을 살며 글을 쓰고, 책을 출간하면서 이제 조금 죽음과 친숙해졌다.
내가 준비되자 부르는 곳이 생겨났다. 가을에는 죽음에 대한 의미있는 강의도 했다. 그 누구보다 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치유와 소망의 말이 되었다. '진실한 나'에게서 나오는 말이라, 그저 전한 것으로 족했다. 누구에게 어떻게 들리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는 느낌의 강의는 흔치 않다. 쓸 수 있어서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말하고 나니 다시 내 안에 새로운 것이 일렁이고, 그것들을 다시 써 내려갔다. 그러면서 사선을 넘었다.
오늘은 아버지 추도식이다. 30주기야, 30주기야. 했는데 동생과 통화하다 40주기라는 것을 알았다. 30 년이 아니고 40년이라고? 어떻게 난 아직도 40년 된 죽음에 매여 있을까? 라고 말했더니 동생도 그렇단다. "나도 그래" 내 현재 생각과 감정의 습관의 많은 것들이 아버지 죽음에 가 닿는다.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며(극복일까?) 사느라 생긴 어떤 것들이다. 상처는 존재의 무늬다,라고 한다면. 내 존재의 가장 선명한 무늬니까.
엄마의 죽음이 아버지 죽음까지 치유하고 있다. 모든 죽음을 치유하고 있다. 겨울(아버지 돌아가신 12월 16일이 있는 겨울)이 다가오면 괜히 두렵고, 더 슬펐던 그런 느낌도 흐릿해졌다. 슬프고 아파서 가지만 앙상한 겨울 나무를 쳐다보지도 못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다. 텅 빈 가지 사이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여백의 아름다움에 충분히 머무를 수 있다. 40년이다. 죽을 때까지 아버지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안다. 내 존재의 가장 큰 무늬니까. 이제는 조금 그 무늬가 사랑스럽다. 아버지 있는 아이인 척, 아무리 잘 연기를 해내더라고 나는 아버지 없는 아이였는 걸... <슬픔을 쓰는 일> 후반부에서 '고아 의식'이라 이름 붙이고 충분히 머무르며 할 만큼 했더니 생긴 힘이다.
아버지 없는 아이(이제는 아이도 아니지!)로 산 40년. 괜찮았다. 이렇게 말하면 그리움과 슬픔이 바짝 목까지 치밀어 오르는 건 또 다른 마음의 길인 듯한데. 슬프고 그리운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괜찮았다. 엄마 아버지가 슬프고 그리울수록 죽음이 친밀하게 다가오고, 삶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이 몸으로 느껴지니 말이다.
박미라 선생님의 송년 글쓰기에 참여한 것은 내 나름의 12월 리추얼이다. 해마다 12월이 다가오면 "피정 갈 때가 됐네"하는 소리가 마음에서 들렸다. 일상에서 물러나 침묵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왔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이 역시 12월, 아버지 떠난 자리의 흔적이었다. 알 수 없는 슬픔, 외로움이 밀려와 기도하러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곤 했던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있는 피정이 없었다. 영혼은 메말라 울부짖는데 물러날 곳이 없었다. 그러다 눈에 들어온 '송년 글쓰기'이다. 피정 대신 선택했다. 좋은 선택이었다.
사선을 넘어 온 1년이다. 40년 전의 죽음, 1년 몇 개월 된 치명적인 죽음을 마주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왔는지 내가 대견하다. 잘 살아오느라 참은 눈물이 많아서 아직도 한참 더 울어야 한다는 것도 알겠다. 평생 울어야 할지도. 아버지 추도식에 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 사진에서 눈만 편집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니 "엄마야?" 했다. "그래, 엄마야. 우리 엄마야." 내가 봐도 내 눈 같으니... 내 눈 같은 엄마 눈과 눈을 맞추고...
엄마, 아버지 추도식인데... 엄마가 보고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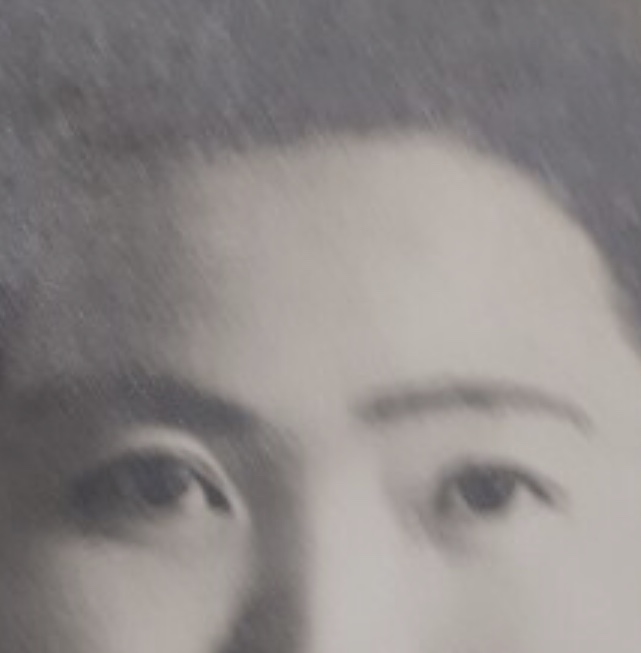
2007.11.13 - [정신실의 내적여정] - 겨울나무 똑바로 보기
겨울나무 똑바로 보기
잎이 떨어져가는 겨울나무가 유난히 싫다. 베란다 창 앞에서 지난 여름 나를 행복하게 해줬던 대추나무 잎이 하나 둘 지고 있다. 이 가을 지내며 확실히 알게 되었다. 내가 겨울나무를 싫어할 뿐
larinari.tistory.com
2013.11.18 - [JP&SS 영혼의 친구] - Sabbath diary8_쓸쓸한 산
Sabbath diary8_쓸쓸한 산
그 : 여보, 저기 봐. 멋지지? 수묵화 같은 모노톤의 산이 좋다. 나는 약간 쓸쓸함이 있는 느낌이 좋아. 나 : 나는 쓸쓸한 산 안 좋아해. 특히 막 시작되는 쓸쓸함은 더더욱...... (몇 년의 내적작업으
larinari.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