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저기 흔하게 굴러다녀도 내겐 너무나 절실하고 소중해서 입에 올리지 않는 말이 있다. '영성'이 그렇다. 예를 들면 '일상 영성'은 내 글쓰기가 뿌리내린 곳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어쩐지 입에 올리기는 싫다. 영성 앞에는 어떤 단어를 갖다 붙여도 그럴듯하다. 연구소의 상담은 궁극적으로 영성 상담이고, 에니어그램 세미나는 영적 여정이고, 종강을 향해 가는 연구소 지도자 과정은 우리만의 '여성 영성'을 일궈가는 일이지만. 감히 '영성'이란 말을 표방할 수 없다. 이유는 단 하나, 소중해서 그렇다.
요즘 화요일 12시는 일주일 내 마음 가장 맑아지고, 겸손해지고, 경건해지는 시간이다. 연구소 글쓰기 강좌인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가 끝나는 시간이다. 오늘은 정말 가장 은혜로운 예배를 마치고 나온 느낌이었다. 정결하게 하는 샘에 내 영혼 씻겨 나온 느낌. 과장이 아니다. 오늘만 해도 글쓰기 모임을 시작하는 9시 30분 어간. 출근하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상해 있었다. 전 같으면 견적이 이틀은 나오는 '꼬인 마음'인데. 모임 마치고 미용실 갔다 나오니 발길이 절로 남편 사무실로 향했다. 아무 일 없는 듯(없는 척이 아니라 아무 일 없는 마음이 되었다) 마주하고. 잠시 산책을 하고 사이좋게 퇴근하여 들어왔다. 읽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겠지만, 이건 깜짝 놀랄 일이다.
이래저래 읽고 쓰는 모임을 오래 전부터 끊임없이 해왔지만, 목회자 성폭력 생존자들과 함께 하는 글쓰기 모임이 전환점이 되었다. 듬성듬성 알았던 것을 벼락처럼 깨달았고, 순간순간 짧게 맛보던 것을 진하게 경험했다. 쓰기의 힘이 아니라 존재의 힘을 무한 신뢰하게 되었다.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존재가 쓴 진실한 글이 날카로운 칼처럼 어딘가를 찌르는 느낌, 그 느낌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었는데, 그 머무름이 곧 치유라는 것을 온몸으로 배웠다. 단지 글, 단지 말이 아니라 몸으로 배운 것이다. 이제 모든 글쓰기 모임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고통에 함께 머무름과 그 시간이 주는 놀라운 치유력은 내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늘 경이롭기는 하지만.
'나'를 주제로 두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는 시간. 나에 대해 내가 가진 이미지, 나의 기억, 나의 감정과 몸, 내가 믿는 하나님. 나, 나, 나. 나에 대해 공부하고 쓰지만 심리학적 자기 분석은 아니다. 글쓰기 지도를 하는 시간은 더더욱 아니다. 영성 모임이다.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것이지만 앞의 나와 뒤의 나는 다르다. 그래서 영성 모임이다. 영적 존재인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의 나에서 시작하여 더듬어 가는 시간. 지금 여기의 나에서 시작하자니, 지금 여기의 나는 맥락 없는 내가 아니라 내 경험의 산물이라. 그때그때 올라오는 내 인생 이야기들을 물 흐르듯 써간다. "물 흐르듯"은 글쓰기 영성 모임의 캐치 프레이즈로 삼아도 좋을 말이다. 다른 표현으로는 "글이 이끄는 길을 따라". 모인 자리에서 바로 쓰는 10분, 15분 안에 쓰는 짧은 글이 주는 깊이와 울림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매시간 "내가 돈을 받으며 글을 배우고, 삶을 배운다"는 느낌이 든다.
쓰는 것은 참말로, 정말로, 진실로, 주체적인 행위이다. 그 주체성과 자발성, 그리고 투명함이 일궈내는 신비일 것이다. 주체적이고 자발적이고 투명한 태도. 이것을 가진 존재를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심리적 존재? 아니다. 그 이상이다. 초월적이고 신비적이 존재. 한 사람 안에 있는 치유와 창조성의 힘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은 '영적 존재'의 증거이다.
화요일 오전 9시 30분, 나는 가장 거룩하고 영적인 시간을 마주한다. 일주일을 살게 하는 본 예배이다. 아, 심야 기도회도 있다. 토요일 자정, 맞다 밤 12시. 영적인 시간이 한 번 더 있다. 미주 서부 동부의 예배자들과 함께 심야의 글쓰기 예배가 있다. 이 즈음 내 영혼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시간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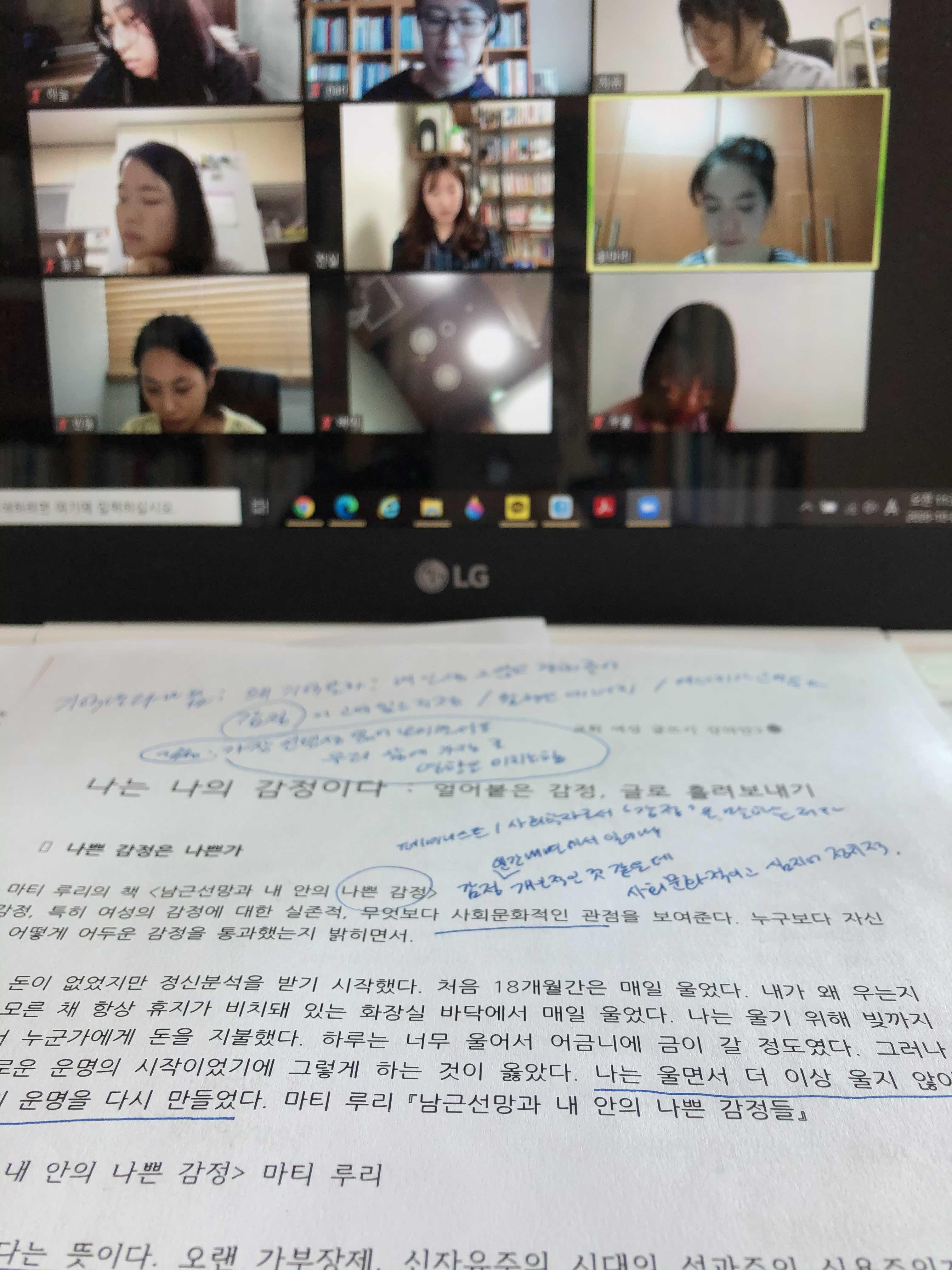
'정신실의 내적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나음터 (송년) 글쓰기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 (2) | 2020.11.11 |
|---|---|
| 중년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 (0) | 2020.10.22 |
| zoom이 나를 보여zoom (2) | 2020.09.11 |
|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_오전반 (0) | 2020.09.08 |
| 한 이름, 한 사람 (0) | 2020.08.23 |
